[김유진의 현장에서] 정부의 실물경제 방역 성공할까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원 자금 수혈에 성공한 두산중공업이 신사업 확대에 나서 향후 성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원책이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 시장 원리에 대한 역행인지, 일시적 유동성 고갈을 해소할 단비인지 이견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다.
지난 30일 주주총회에서 주총 의장을 맡은 최형희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사장은 “2023년까지 신사업 수주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수주 포트폴리오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스터빈, 신재생, 서비스를 비롯해 수소, 3D 프린팅 등의 신사업으로 정상화 발판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업계 안팎에서 두산중공업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한 배경엔 두산중공업이 국책은행인 KDB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과 맺은 1조원 규모의 대출 약정이 있다. 국책은행이 기업을 위해 1조원대 긴급 수혈에 나선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를 대로 마른 기업 유동성에 정부가 인공호흡을 시작하면서다. 이는 당장 한국은행이 4월 1일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산업은행이 1조9000억원 규모로 회사채 인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배경과도 일치한다.
정부의 기업 살리기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달려 있는 듯하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간의 이목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로 넘어왔다.
채권시장안정 펀드가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잠정 설정하고 있는 만큼 하위 등급 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달려 있다. 당장 4월 만기 회사채 가운데 중간 신용 등급인 ‘A+’ 이하~ ‘BBB-’ 이상 채권만 1조4550억원 규모다. 자금 확보에 겪는 어려움은 크지만 자생력이 낮은 이들 기업에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업계의 우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낙인효과에 쏠린다. 우량 채권 지원책은 시장의 격렬한 저항 없이 도입됐다. 기업과 주주의 부담을 국민 전체가 나눠지게 되겠지만, 일단은 기업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는 시장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이는 그만큼 전국민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걸 방증한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등급에 대해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는 좀 더 복잡한 문제다.
업계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낙인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신속인수제도를 신청한 기업을 오히려 회사가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으로 인식하면서,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거나 정책 당국의 유동성 투입 이외의 경로가 제한되는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시장이 이번 사태를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험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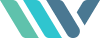 뉴스
뉴스
